사실 이번 지진 해일구호의 첫 출장지는 인도네시아가 아니라 스리랑카였다. 지난 해 12월 26일 아침,
남아시아 일대에 일어난 대형 해일로 수 천 명의 사상자가 났다는 뉴스를 접하면서 처음에는 이번 재난이
이런 어마어마한 규모로 커질것이라고는 예측하지 못했다. 이 정도 규모의 재난은 방글라데시, 인도 등
남아시아 지역에서는 수시로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상자의 수가 당일 오후에 벌써 만 명에
육박하는 것을 보고는 본능적으로 이런 생각이 스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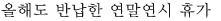
“올 연말연시 휴가도 물 건너갔구나.”
재작년 이란 밤시 지진도 바로 12월 26일에 일어나서 연말연시 휴가를 반납하고 동분서주 일했는데
만 일년 만에 또 다른 대규모 재난이 일어난 것이다.
재난 발생 3일째인 12월 29일, 스리랑카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피해자의 숫자를 발표하기 전이라 사상자 2만 여 명으로 파악된 스리랑카 동부해안이
그때까지로는 해일 최대의 피해지역 이었다. 일년 내내 벼르고 벼르던 연말 휴가를 고스란히 반납해야하는
아까운 마음보다는 현장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에 몹시 흥분되었다.
스리랑카 동부지역 바티칼로. 이번 대지진의 직격탄을 맞은 해안지역이다. 이 세상에 생지옥이 있다면
바로 이런 모습이리라. 미처 치우지 못한 시신이 해변에 방치돼 있고 그 주위를 굶주린 개들이 어슬렁거렸다.
간밤 폭우로 불어난 물 위로 시체가 떠다니고 그 위로는 까마귀 떼가 깍깍거리며 하늘을 뒤덮고 있었다.
마치 공포영화를 보고 있는 듯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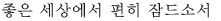
사진을 찍으려고 왔다갔다하다, 무심코 돌아보니 발밑에 어른 시신이 있는 게 아닌가. 어찌나 놀랐던지,
뒷걸음치다가 하마터면 밟을 뻔했다. 동네사람들은 그런 시신을 하도 많이 보아서일까 담담한 표정이지만,
우리 일행은 도저히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었다. 적어도 개나 까마귀가 훼손하지 못하게 해 주어야 할 것 같았다.
이미 너무 늦은 오후라, 시신 인양팀을 부를 수 없어서 아쉬운 데로 근처 해일 쓰레기더미에서 천을 구해다가
시신을 잘 덮어주고, 혹시 몰라, 폐타이어로 천 네 귀퉁이를 눌러주었다. 누구 누구의 아버지이자 아들이었을
그 시신의 주인, 지금도 그 가족들이 애타게 찾고 있을 그 시신의 영혼이나마 부디 좋은 세상으로 가기를
간절히 바랬다.
해안가는 누군가 공들여 치워놓은 것처럼 깨끗했다. 촘촘하던 어부들의 초가 오두막은 흔적도 없고 콘크리트
빌딩은 불도저로 밀어놓은 것처럼 완전히 부서졌다. 물이 덜 빠진 곳에서는 썩는 냄새가 진동했다.
마을사람들은 무너진 집 더미 밑에는 아직 시신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했다. 이곳 사람들은 그 더러운 물을
매일 건너 다녀야 했다. 나 역시 바지를 종아리까지 걷어붙이고 건넜는데 발밑에 물컹한 게 밟힐 때마다
얼마나 오싹했는지 모른다.

그날 밤, 자다가 놀라서 일어났다. 커다란 벌레가 다리로 스물스물 기어 다니는 것 같은 가려움을 참을 수가
없었다. 불을 켜고 보니 양쪽 종아리에 두드러기가 난 것처럼 벌겋게 부어올랐다. 가려운 것도 가려운거지만
이게 혹시 아까 오염된 물에서 옮은 피부병은 아닐까, 은근히 걱정이 됐다. 같이 갔던 일행에게는 말하지 않았다.
그러지 않아도 힘든 현장에서 괜한 나 때문에 신경 쓰게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가려움증은 스리랑카에 있는 내내 단 잠을 방해했다. 왜 꼭 한밤중이 되면 더 가려워지는 모르겠다.
참을 수 없어 한번 긁기 시작하면 밤새도록 긁느라 잠을 설쳤다. 며칠 후에는 밤만 되면 열까지 펄펄 나는 게
혹시 말라리아는 아닐까 의심도 했다. (알고 보니 고열은 몸살 때문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