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꾸 구역질이 났다. 냄새 때문이다.
인도네시아 반다아체공항을 나오자마자 생선 썩은 악취가 진동을 한다.
공항근처에 대규모 시신 매립지가 있기 때문이란다. 저녁 늦은 시간인데도 아직 수백 구의 시신을 실은
몇 대의 트럭이 매장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다. 매립지가 가까워지는지 악취가 점점 심해졌다.
현지직원들은 마스크를 쓰고도 코를 막는다. 정말이지 구역질을 참을 수 없었다.
지난 4년간 긴급구호팀장으로 아프가니스탄 전쟁, 남부아프리카 기근, 이라크 전쟁, 이란 지진 등
많은 긴급구호현장을 거쳤지만 이런 참상은 처음이다. 재해 발생 일주일 이내에 현장에 온 것 역시
이번이 처음이라 더욱 그렇게 느껴졌을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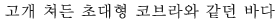
수 천 채의 건물이 이렇게 장난감처럼 무너지고 콩가루처럼 부서진 쑥대밭인데 사람인들 온전했겠는가?
한 순간에 10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다는 게 감히 상상이 된다. 난민촌에서 만난 12살 난 꼬마 무스타파는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전했다.
“저쪽 해안 끝에서 이쪽 끝까지 마치 시커먼 초대형 코브라가 고개를 있는 대로 치켜세운채 육지까지 달려와
한 순간에 모든 것을 싹 쓸고 간 것 같았어요. 그 코브라가 엄마, 아빠 그리고 여동생도 같이 삼켜버렸어요.”
내가 그곳에 있었던 일주일전까지 시신수습이 가장 중요한 과제였다. 세계 각국에서 온 군인들과 굴착기 등
중장비가 투입되어 수습에 박차를 가하며 피해현장을 빠른 속도로 정리하고 있었다. 그러나 당일 발굴한
시신은 그날 저녁 군인이나 경찰이 트럭으로 수거해가더라도, 늦은 오후까지는 까만 비닐에 싼 수많은
시신들이 길 양옆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다. 제대로 싸지 못한 비닐 밖으로는 죽은 사람의 손이
삐져나와 있고 가스가 차서 빵빵하게 부푼 시신의 배는 눈앞에서 터져 내장이 사방으로 흩어지기도 했다.
눈을 감고 싶을 정도로 처참한 광경이다. 그러나 살아남은 사람은 살아야 한다. 그리고 살릴 수 있는
목숨을 어떻게든 살려내는 것이 긴급구호팀의 임무이다. 따라서 긴급구호는 대단히 체계적이고
전문적이고 전략적으로 수행되어야만 하는 일이다.

대규모 재난현장에서의 구호활동은 90일을 기점으로 긴급구호와 재난복구로 나뉜다. 긴급구호는
초기 일주일의 수색 및 구조단계, 30일 내의 피난민 구호단계, 90일 내의 일상 복귀준비 단계로 진행된다.
이 긴급구호단계를 병원으로 비유해 재난발생 30일까지는 응급수술실에 해당한다. 사람을 살려야하는
절체절명의 단계다. 때문에 고도의 훈련된 전문 인력과 즉시 운용할 수 있는 초기 자금 및 긴급구호물자
그리고 구호시스템 총가동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후 90일까지는 구호는 중환자실이다. 이 때에도 산소 호흡기 등 여러 가지 중장비와 고급 전문 인력이
필요한 시기다. 이런 중요한 때에 비전문가가 얼씬거린다면 응급수술실에서 애써 살려놓은 사람의 목숨도
보장할 수 없다. 때문에 UN, 국제적십자위원회, 기아대책기구, 월드비전을 포함한 국제 비정부기구(INGO)들은
90일 내의 비전문 자원봉사자들이 현장에 오는 것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90일이 지난 복구단계는 병원으로는 회복실에 해당한다. 아무리 수술이 잘 끝났다고 해도, 바로 퇴원할 수는
없는 일. 혼자 밥 먹고 화장실 갈 때까지는 되어야 퇴원 후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