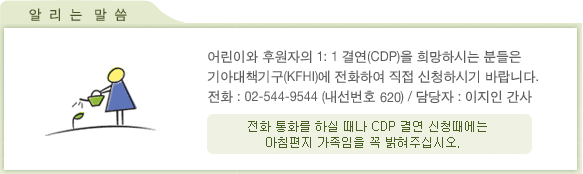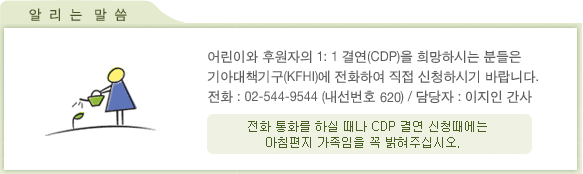| 아프리카는 지금 심한 열병에 시달리고 있다.
물 부족, 에이즈, 말라리아, 열악한 교육 환경, 부족간의 대립과 전쟁, 정치적 후진성 등등
어느 것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를 정도로 심각한 합병증에 신음하고 있다.
짧게나마 아프리카에서 나는 볼 수 있었다.
천혜의 자연 조건 속에 살면서도 무기력할 수 밖에 없는 사람들, 원하지 않던 내전으로 가족을 잃고
땅을 잃고 희망을 잃은 사람들, 불가항력의 전염병과 기아에 그대로 노출되어 시한부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축복 속에 태어나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야 할 아이들이 흙탕물을 마시며 시들고 있는 모습을
무수히 보게 되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돌아온 며칠 동안은 내내 뭔가 무거운 짐을 잔뜩
안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과연 무얼 할 수 있을까...
아프리카의 문제 덩어리가 산처럼 크고 엉킨 실타래처럼 복잡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고, 그러면서 시급성이 요구되는 그 절박함이
나의 가슴을 답답하고 막막하게 만들기도 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나니, 어느덧 내 머리속에서 커다랗기만 했던 아프리카의 문제가 조금씩
작아지기 시작했다. 자료나 통계로 접한 '병에 걸린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이 아닌, 내가 만났던 아이,
나와 얘기를 나눈 젊은 청년, 손을 잡고 얼싸안고 어깨동무를 했던 사람들의 얼굴만이 남게 된 것이다.
제일 먼저 그들을 위해 기도부터 시작했다.
아프리카는 물이 없는 나라였다. 병이 많은 나라였다.
배우지 못한 사람이 많았고, 축복 받지 못한 출생도 많았다.
하지만 아프리카에는 나무가 많았다. 아이들이 많았다. 웃음이 많았다.
환호가 많았고, 가능성이 많았다.
아프리카의 풍부함.
그것이 나쁜 것의 풍부함이든, 좋은 것의 풍부함이든 어느 한 구석도 비어 보이지 않고
무언가로 가득 차고 넘치는 듯 보였고, 그 풍부함이 나에게는 신기함으로, 반가움으로, 행복함으로
때론 안타까움으로, 슬픔으로, 고통으로 다가왔다.
의아했던 건, 그 '풍부한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의 표정에서 그 어떤 불행이나 주눅들음, 자괴감 따위를
찾아볼 수 없었다는 점이었다. 괜한 자존심을 세우거나 자신감이 결여된 표정도 보지 못했다.
언제나 찾아온 손님들을 반갑게 맞고, 항상 손을 내밀고, 가까이 다가왔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느낌을 받지 않았나 싶다.
아프리카를 떠나던 마지막 날, 그 동안 우리를 시종 안내하고 통역도 맡아주었던
이상훈 선교사님으로부터 언젠가 보도되었다는 재미있는 기사 내용을 전해 듣게 되었다.
"전 세계에서 국민들의 행복 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 행복만족도가 가장 높은 나라가 우간다"라며
"우간다 사람들은 자신들을 측은하게 바라보는 외국 사람들의 시선을 오히려 더 이상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우리가 그들보다 좀더 문명화된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해서, 그들의 존재 자체를 불쌍하게 생각하고
동정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라는 생각이 번쩍 들었다. 그들을 측은하게만 바라볼 게 아니라,
다만 그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어찌 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회적 시스템에 의한 고통을
함께 나누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들을 행여라도 아래로 보고 어려운 사람이니 동정을 베푼다는 방식이 아닌 내 동료, 내 가족처럼 여겨
그들의 등을 진심으로 토닥여 줄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나눔이 이루어지고 행복한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럴 때 지구촌은 진정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닐까.
평생을 바쳐 아프리카를 위해 헌신 봉사한 슈바이처박사의 말이
때맞춰 내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었다.
"이상의 힘은 무한하다. 한 방울의 물은 무력하게 보이나
그것이 바위 틈새에 들어가 얼면 바위도 가르게 된다."
아프리카 케냐에서의 마지막 밤, 케냐의 기아대책기구 사람들과 우리 일행이
함께 저녁식사를 하게 되었다. 저마다 자신이 태어난 곳을 떠나 아프리카에서 만난 사람들로
특별한 뜻과 소명감을 가지고 이 땅으로 들어와 온갖 어려움과 고통을
견뎌내며 아프리카를 위해 봉사하는 사람들이었다.
한 선교사님은 밤 늦게 자동차를 타고 가다 강도가 쏜 총에 차 유리가 깨지면서
유리 파편에 한쪽 눈이 실명하는 사고를 당했음에도, 한국에서의 치료 후 다시 아프리카로 되돌아와
현재 물이 나오지 않는 지역에 열심히 우물을 파주고 있었다.
현지에서 만난 선교사님들의 노고를 어찌 다 표현할 수 있겠는가.
우간다의 쿠미대학에서 만났던 원팔연 목사님과 함께 동행한 전주 바울 교회의 최동완님의
아들이기도 한 케냐 마사빗의 최인호 선교사는 우리가 아프리카 방문에서 만났던 선교사들 중
가장 오지에 들어가서 사역하고 계신 분이었다. 특히 최선교사님의 아내 한지선님은
이화여대 성악과를 졸업한 분으로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두 아이를 키우며 이곳에
최선교사와 함께 음악학교를 세워 아프리카 아이들에게 음악교육을 통한
희망과 사랑을 전파해 줄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아프리카 일정 내내 우리를 안내하고 통역을 맡았던 이상훈 선교사님은
"아프리카 생활이 10년이 넘다 보니 이제는 점점 아프리카가 더 편한 곳이 되고 있다"면서
그래도 여전히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 제가 이 일을 계속 해야 합니까?"라고
자문하게 될 때가 가장 힘들다고 고백했다.
그 밖에 쿠미대학 교회의 김태성 목사님, 우간다의 오서택 목사님, 그리고 조이크리스챤학교의
김순옥 선교사님, 우물 프로젝트의 이용주 선교사님 등 이 모든 분들이 감당하고 있는 일은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이 없었다. 특별한 소신과 믿음으로 하나하나 기적을 이뤄가고 있는 그 분들의 모습 속에서
물 한 방울의 힘이 바위를 가른다는 말이 절대 공감으로 다가왔다.
한국에 돌아와 고도원님과 아프리카 방문기를 함께 준비하면서 이런 저런 얘기를 나누게 되었다.
그러다가 주윤정 선교사의 무덤에서 오열하신 까닭을 듣게 되었다.
"내 딸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라며 이렇게 덧붙이셨다.
"숭고한 정신을 가진 젊디 젊은 사람이 자신의 뜻을 미처 피우지도 못하고 져버렸다는 데서 오는
그 안타까움이 너무 컸고, 하나님이 왜 순결하고 어린 양을 제사의 재물로 삼으셨는가 하는
깨달음이 나를 오열하게 했다"
그리고는
"그녀의 죽음은 작게는 가족에서부터 친구들, 주변 선교사들, 그리고 그 곳을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의 가슴에 안타까움과 슬픔을 넘어 기적같은 큰 힘을 발휘하게 할 것이다.
몸은 죽었지만 그와 그녀의 영혼은 그래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
아프리카라는 천혜의 아름다운 땅이 더 이상 저주의 땅에 머물지 않고 다시없는 축복의 땅이
될 수 있도록 아프리카인들 자신들이 발벗고 나설 모습을 기대해본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아프리카 여기저기서 목숨도 마다하지 않고 헌신하고 있는 수많은 한국인 선교사와 봉사자들,
그리고 전 세계에서 모인 수많은 '슈바이처'들이 아프리카가 현재 앓고 있는 이 지독한 병을
더이상 오래 두고 보지 않으리라는 것을 믿게 되었다.
이젠 마음이 편해졌다. 그곳은 분명 변할 거라는 믿음이 생겼으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