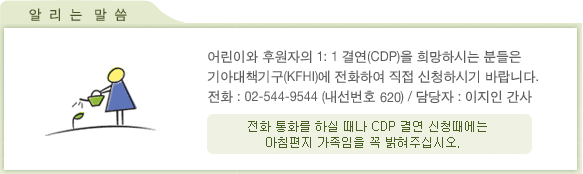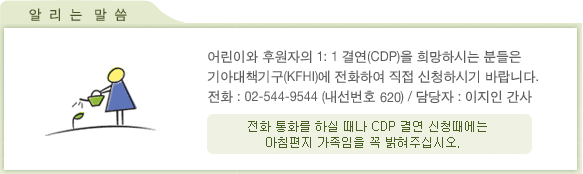| 케냐 마사빗의 '닌딜레족'이 사는 모습에서도 극명하게 보았겠지만
그곳의 가장 큰 문제점, 더 나아가 아프리카의 가장 큰 문제점은 다름 아닌 '물'이었다.
'마시는 물'의 문제가 너무나 심각하다 보니 '씻는 물' 정도는 감히 엄두도 못 내고 사는 게
당연한 일이었다. 물 문제만 어느 정도 해결돼도 이곳 아프리카 사람들 질병의 80%가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좀더 깨끗한 물을 마시고, 오염되지 않은 물로 몸을 씻을 수만 있어도
아프리카 사람 대다수가 현재의 질병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곳 아이들의 질병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이 기생충이고, 두 번째가 피부병, 세 번째가 옴,
다음이 진드기에 의한 질병이라고 한다. 가만히 살펴보면 모든 병이 결국 깨끗한 물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세계의 주요 NGO 단체들이 아이들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끊임없이 약을 공급해주고
있지만
소용이 없는 이유도 물 때문이다. 약을 바르거나 먹어서 상처나 병이 어느 정도 나았다 해도
깨끗하게 씻질 못하기 때문에 위생 문제에 그대로 노출되어 다시 감염되고마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현실이다.
사실 아프리카의 수자원은 그 어느 지역보다도 풍부하다.
아프리카 세계 인구 비중이 13%인데, 세계 수자원 비중이 11%로 인구 대비 물의 비중이
매우 높은 편이다.
반면에 아시아는 세계 인구 비중은 60%인데, 세계 수자원 비중은 36%로 절반 정도에 그치고 있다.
이 수치에서도 볼 수 있듯이 아프리카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빅토리아
호(68,423㎢)를
비롯하여,
앨버트 호, 키가 호 등의 큰 호수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 사람들은 지금도 부족한
물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 아이러니한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조금만 더 자세히 아프리카 역사를 들여다보면 해답은 금방 나온다.
본래 아프리카는 천혜의 지상낙원이었다.
그러다 어느 날 '노예사냥'이 시작되고, 식민지 쟁탈전이 벌어졌다.
자신들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국경이 생겨나 부족이 갈리고 서로 쫓겨 다니거나 전쟁과 내전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된 것이다.
더 큰 재앙은 내부에서도 있었다.
우간다의 '이디 아민' 같은 포악한 독재자의 등장이다. 그의 재임 기간 9년 사이에
60만 명의
우간다인이 학살을 당했고, 그 썩은 시체들과 그들의 피가 그대로 빅토리아 호수 물로 흘러 들어가도록
방치되고 말았다. 마치 우리가 한때 넘치는 한강 물을 보면서도 오염 때문에 마실 수 없는 것처럼,
아프리카인들도 천혜의 호수를
옆에 두고도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 비극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땅을 파 우물을 만들면 될 것 아닌가"라고 누구나 쉽게 생각할 수 있다.
맞는 말이다. 아프리카 땅 웬만한 곳은 깊이 파 들어가면 어디서든 물이 나온다.
그러나 이 또한 그림의 떡일 뿐이다. 우선 개인들은 우물을 직접 팔 재력이 없다.
일반적인 경우 아프리카에서 우물을 하나 파는데 7,000달러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데
개인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돈이다. 그렇다면 정부가 나서 이 일을 해야 하는데 내전으로, 권력 다툼으로, 독재로
그럴 여력이 없다.
국가적 차원의 상하수도 시설 같은 건 꿈도 못 꾸는 상태인 것이다.
이런 문제들을 돕기 위해서 기아대책기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우물 프로젝트'이다. 케냐에서의 마지막 날 아뜨리버(Athi River)라는 곳에 건립된
VTC(Vocational Training Center) 직업훈련센터에 진행된 '우물 프로젝트'
현장을 둘러보게 되었다.
이 직업훈련원은 전두환전대통령 재임 때 아프리카 순방의'선물'로 300만 달러(약 30억)라는
거금을 들여 세웠으나 설계 당시 정작 수도 시설을 하지 않아 그 좋은 시설을 가지고도
5년 동안 문을 열지도 못한 채 방치되고 있던
곳이었다. 그러다가 기아대책의 '우물 프로젝트'로
지하수를 뽑아 올림으로써
비로소 문을 열게 되었다.
이 우물 개발 사업 진행을 맡았던 케냐의 이용주선교사의 설명에 따르면,
"128m정도 파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을 가지고 98m정도 들어가니까 깨끗한 물이 나오기
시작했다"고
한다.
현재 이 우물 펌프는 시간당 7톤 가량의 물을 끌어올리고 있다고 했다.
처음 물이 나오던 날, 이곳 학생, 주민, 그리고 관계자들의 반응이 흥미로웠는데,
그들은 한결같이 펑펑 쏟아지는 물을 보며 "와! 기적이다", 혹은 "마술을 부린 게
아니냐"며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했다고 한다. 그리고 이용주 선교사 등 이 우물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팀에게는
'멀리서 물을 가져온 사람들', 또는 '생명을 가져온 사람들'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었다고 한다.
성인 한 사람이 하루에 필요한 물의 양이 평균 15리터라고 한다.
마시기도 하고 씻기도 하는 물의 양이다. 그러나 우간다의 경우, 하루 한 사람이 쓸 수
있는 물의 양은
성인 평균 2리터라고 한다. 이곳 사람들은 그 2리터를 구하기 위해 참으로 필사적인 노력을 하고 있었다.
자동차를 타고 어디를 가든지 어린이나 어른들이
노란 플라스틱 통을 들거나 머리에 이고
물을 길러 다니는 모습을 너무도 흔하게 볼 수 있었다.
문득 우간다 쿠미에서 묵었던 호텔이 생각났다.
호텔, 말이 호텔이지 마치 1인용 감방을 연상시키는 곳이었다. 그래서 실제 이름인
'그린탑 호텔'을
'감옥탑 호텔'이라고 불렀을 정도였다. 시설이 열악한 것은 그렇다 쳐도 여기서도 물이 문제였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5리터짜리 플라스틱 한 통에 우리 돈으로 200원씩(이 돈도 여기서는 꽤 큰 돈이다)을
주고 사서, 그 물을 호텔 한쪽에 마련된 물탱크에 옮겨 담고 그 통에 담긴 물을 그 곳에
투숙한 손님들이 나눠 써야만 했다.
만약 한 사람이 샤워를 오래하거나 빨래를 했을 경우엔 그만큼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밖에 없었다. 실제로 어느 날은 머리를 감다가, 어느 날은 이를 닦다가 물이 끊겨 난감해 한 적도
있었다. 한국에서 하던 습관대로 물을 썼다간 옆방의 사람이 큰 낭패를 보겠구나 싶어
일명 '고양이 세수'같은 샤워를 했던 기억이 있다.
나에겐 적은 양의 물로 어렵게 샤워를 한 것조차 생소했던 경험으로 기억이 되고,
물 걱정이 없는 우리나라에 돌아온 후부터는 다시 경험하기 힘든 일이 되어버렸지만
한 동이 물을 얻기 위해 보름을 걸어가야 하고, 그나마도 자기 줄 앞에서 물이 떨어지면
두말없이
먼 길을 다시 되돌아 와야만 하는 고문 같은 아프리카 사람들의 끔찍한 생활과,
황톳물을 마시며 운동장에서 뛰놀던 이곳 아이들의 기억만큼은
아마도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지난 3월22일, 제13회 '세계 물의 날'을 맞이했다.
어느 신문에는 지구촌의 물 부족 사태가 에이즈, 기아 문제와 함께 ‘'1세기의 3대 재앙'이
될 것이라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현재 안전한 식수를 공급 받지 못하는 인구는 약 11억 명"이라고 썼다.
"11억 명? 그 많은 사람들이 그럼 다들 뭘 마시며 살아간데?"
내가 만일 아프리카를 다녀오지 않았다면 그 기사를 보고 그저 이 정도의 혼자말로
흘려버렸을 지도 모른다. 나에게 전혀 실감이 나지 않는 먼 나라의 이야기로 들렸을 테니까...
그러나 이제는 아니었다. 아프리카에서 만나고 스쳐 지나갔던 수많은 아프리카 사람들,
특히 검은 피부에 반짝이는 눈, 웃을 때 드러나는 하얀 이의 아이들이 자꾸 자꾸 떠올라
이젠 그런 기사가
남의 일 같지 않게 느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내가 만났던 기억속의 사람들이 11억 명 가운데
한사람, 한사람이었다는 사실이 그 기사를 읽는 동안 내 몸을 전율케 했으니까.
그래서일까. 짧다면 짧았던 아프리카로의 여행이 내 일상에 작은 변화를 주었다.
쓸데없이 물을 틀어놓고 쓰는 좋지 않은 습관을 발견하게 되었고, 나도 모르게 틀어놓은
수도꼭지를 얼른 잠그게 했다. 그 행동이 지금 당장 아프리카의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는 어떤 도움을 줄 수는 없겠지만 말이다.
|